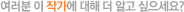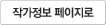가깝고도 먼 ‘근린자연(近隣自然)’
- 다음의 글은 2008년 9월 16일, 조이한(미술사, 남성학) 김정근(독문학, 연극학) 부부와 공성훈이, [공성훈 개인전: 근린자연]에 출품할 작품들을 놓고 방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공성훈(이하 공) : 작년 개인전엔 모텔이나 운동장 등의 건물들을 그렸었쟎아요? 이번엔 좀 더 자연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이번 그림들이 프리드리히(Caspar D. Friedrich)나 낭만주의 풍경화 같은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풍경화를 빗대서 현실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담아내는 방식이 지금 좀 직접적인 것 같아요.
* 조이한(이하 조) :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이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숨어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숨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공 : 어느 정도는 숨겨야죠. 숨기려면 풍경화를 좀 더 풍경화스럽게 잘 그려야 했어요. 드로잉적인 방법이 좀 더 개념적이 되기 쉽쟎아요? 반면에 설명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아니었고.
* 조 : 원래 프리드리히 풍경화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요.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풍경화에서 입고 있는 옷, 왜 달빛을 등지고 바라보는 자세라든가 그런 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요. 프리드리히가 가지고 있었던 혁명에 대한, 이성주의에 대한 동경 그러나 좌절 그런 것들이 표현된 거다 그렇게 흔히 해석이 되죠. 제가 보기엔 이 작품들에선 그런 식의 풍경화 그러니까 낭만주의 풍경화 플러스 상징주의 풍경화의 어떤 뉘앙스도 많이 드러나는 것 같고.
* 김정근(이하 김) : 아까 낭만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순수한 자연은 이 작품에서는 하나도 없죠?
* 공 : 예 이거 다 가짜죠.
* 김 : 사실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데.
* 조 : 낭만주의 풍경화에서의 자연은 원래 그런 거야. 프리드리히의 자연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아니고 조합이거든.
* 김 : 이 그림에서도 저 낙하산이라는 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그 낙하산이 없었을 때 의미하고 있었을 때의 의미가 풍경화로서만 보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차이가 난다고. 그리고 이 그림([인공절벽])에서 이 바위들이 실제 바위가 아니고 만들어진 바위쟎아. 그리고 호수도 만들어진 호수고 이 숲도 인공으로 조림된 숲에 가까운 거니까. 그렇게 보자면 19세기 초와 21세기의 자연 개념이라는 것이 다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낭만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순수한 자연이라는 것도 재정립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도 실제로는 조경이죠?
* 공 : 그렇죠. 바위 옮겨놓고 인공으로 조경한 정원이죠.
* 김 : 순수한 자연과 인공적인 형태가 혼합이 되어있는 게 21세기에서는 자연적인 풍경이 돼버렸거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냐 긍정적인 의미냐 하는 것은 이제 보는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죠. [청와대. 국회의사당 그리고 연꽃]같은 작품은 숨겨진 의미를 상당히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 공 : 근데 사실 별로 숨겨진 것 같지는 않아요.
* 조 : 그건 화가가 자기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관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그렇게 분명하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한참 봐야 돼. 한눈에 그걸 알아채는 관람객은 내가 보기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어? 그거네 하고 2차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
아무래도 푸른색이 많이 들어가면 좀 편해지는 느낌이 들쟎아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까 만들어진 자연이니...
* 김 : 그러니깐 이 자연도 보는 사람들에겐 불편한 느낌을 주는 초록색이예요. 생각하시고 있는 주제와 연관되어, 원래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보게 되면 편안한 느낌을 가져야 하는데 익숙한 듯 하면서도 뭔가 밀어내는 듯한 녹색, 여기서도 이 녹색들이 그림과 동화되는 느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해요.
* 조 : 그런데 왜 압도시키고 싶은 의도가 있으세요?
* 공 : 기괴함을 압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일종의 농담처럼 되쟎아요. 그리고 저 하늘은 엘 그레코(El Greco)의 하늘인데... 그런데 내 그림이 압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린 입장이어서 그런지.
* 조 : 요즘에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과 회화가 연관관계가 많으니까 사진을 출발점으로 삼되 회화적으로 풀어내는 작가들이 사진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화가들을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쪽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리히터(Gerhard Richter)나.
* 공 : 아주 크게 나누면, 사진의 표면을 그리는 사람하고, 사진의 표면을 넘어 사진이 지시하는 원본을 그리는 사람이 있겠죠. 전통적인 회화는 사진이 지시하는 원본을 그리는 것일 테고요. 이번 작품이나 전의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진의 표면을 그리는 척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좀 척은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진의 표면을 그린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사진이 지시하는 사물로서의 원본을 그린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요번 것도 표면으로서의 사진과 사물로서의 나무를 넘어서 다른 이야기꺼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 조 : 그러니까 상징주의적인, 거기다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게 넓어진.
* 공 : 예를 들면 저 [사진찍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화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한 거예요.
* 조 : 이 사람은 어떻게 물을 건너 바위에 올라갔을까?
* 공 : 가짜로 그린 거죠.
* 조 : 하하하. 갈 수가 없는. 그림들의 수평선이 높이 올라가 있어요. 퍼스펙티브(Perspective, 원근법)가. 보통 프리드리히 같은 경우는 수평선이 낮게 깔리쟎아요.
* 김 : 그러면 화가는 이 풍경화들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드러내면서 숨기고 있는 어떤 의미를 관람객이 끄집어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네.
* 공 : 그래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요. 이게 뭐 알아주든 어쨌든 간에 화가로서 투덜거릴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죠.
* 조 : 예전에 공성훈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뭐 그림에서 자꾸 의미를 찾냐 내 그림이 도대체 뭘 그린 거냐 그러면 그냥 개 그린 그림이다. 그럼 그냥 개 그린 그림, 개가 있는 풍경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꾸 거기서 어떤 의미냐를 찾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사실 근대 회화 이후에 그림에서 자꾸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부하면서 그냥 회화 그 자체, 회화성 뭐 이런 것들이 표명되기 시작한 것이 근대회화의 시작이고 그게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 진짜 아무 의미 없이 물감과 물감의 충돌, 긴장 이게 회화다 이런 거였쟎아요. 그런데 그게 20세기 중반인데, 그 이후로 가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해서 할 말이 없어지면서 물감과 물감의 충돌도 할 만큼 다 해봤고 그럼 또 의미로의 회귀냐.
* 공 : 개 그릴 때도 내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죠.
* 조 : 예, 아니 글쎄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를 직접 이야기하는 걸 항상 꺼려하는 것 같애.
* 공 : 전에 하던 설치작업들은 말로 설명하기가 좋은 작업들이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싫어지고. 내 나름으로는 회화로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말하기 싫어지게 된 점도 있어요.
* 김 : 그림을 그리는 전략은 사람을 압도하는 거고 전술이 그로테스크인가요?
* 공 : 아니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화가로서 얘기하자면, 그림이 편안해지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느낌이 들고 아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 : 사실 이런 그림들이 좀 더 중성적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동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화가가 차단, 될 수 있는 대로 없애버리고 있는 거 아녜요?
* 공 : 그래서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다같이 웃음)
* 김 : 이 그림의 경우에도 녹색, 흰색, 빨강색이 훨씬 더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보는 사람이 쉽게 아 풍경화구나 하면서 동화될 수 있는데 본인 자체가 이미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빼 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색조라든가 시선의 높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동화가 잘 안되고.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서양 풍경화들이 사실 보는 사람들을 압도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쟎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인 방식이 경외감보다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느낌을 더 강하게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괴함을...
* 공 : 예 뭐 낭만주의의 숭고미나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죠. 자연을 그렇게 보기엔 우리가 너무 순진하지 않쟎아요. 기본적으로 가짜 자연들이고 이런 그림에서 봐도 왜 우리가 호숫가에 가면 해야 될 것 같은 포즈들이 있단 말예요. 공원에 가족이 가면 취해야 할 것 같은 포즈가 있고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아마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장소에 어울리는 포즈를 하고 그 포즈대로 사진을 찍고 한단 말예요. 연극적이죠. 아마 이 커플도 지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이좋게 둘이 등을 기대고 있는 장면이었을 거란 말예요. 실루엣을 강조해서 그리다보니까 왠지 어젯밤에 싸운 것 같아서 그렇지.
* 김 : 저 그림도 낭만주의와 연결시켜보면, 등장인물들이 인공적인 자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등을 보이고 있는데 프리드리히의 경우에는 그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가상적인 자아가 돼서 관객 자신이 바라보는 자연처럼 동일시하게 되는데.
* 조 : 그렇지, 관조를 하게 되죠.
* 김 : 여기에서는 실제로 관객이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그림에서도 두 인물이 마주보고 있거나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정석인데. 자연이라는 표제어 하에서 거기에 어울리는 인물배치라든가 아무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쟎아요. 여기선 개조차도 서로 떨어져 있네, 하하하. 그렇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자연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되었죠.
* 공 : 애초부터 제겐 조화로운 자연이란 관념은 없으니까요. 옛날 의미의 자연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관객들과는 달리 제 나름으로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동일시가 있어요.
* 김 : 이 그림에서는 이 낙하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일반적인 풍경화와 대별되는 점이 크지 않은데, 특히 ‘모닥불 낭만주의’라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저 낙하산 이라는 미미한 형상을 그려 넣음으로써 소위 ‘모닥불 낭만주의’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연에 가서 산다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 캠프파이어하는 건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풍경화라면 저 낙하산을 지워야 하지만 반대로 낙하산이라는 이물질이 들어옴으로써 앞에 있는 모닥불만큼이나 커다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여요.
* 조 : 그림의 빛들이요, 다 반영이거나 간접이거나 그래요. 이 그림도 빛이 호수 안에서만 존재하고 이것도 인공조명이고 여기서도 물에 비친 부분에서만 빛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뿐 직접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 공 : 그렇죠. 주로 역광이고. 낮을 그리긴 했지만 아주 밝고 화창한 낮은 아니죠.
* 조 : 아주 낮도 아니고 햇빛이나 달빛이 등장하더라도 해나 달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아니고 뭔가에 비친 빛이 등장하고. 거기서도 뭔가 의미를 끄집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의 도시] 그림에서 이 나비들은 왜 여기 있어요?
* 공 : 실제로 고가도로에 그려진 나비들이에요. 조이한씨 집 앞에 있는 건데.
* 조 : 그렇구나. 난 이걸 무심코 지나다니는 거야.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연막치고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팔고 싶다고 항상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장치는 일부러 제거하고. 하하하. 난 항상 의문이라니까. 공성훈씨 그림이 왜 잘 안 팔리는지.
* 김 : 그게 아마 사는 사람이 느끼는 이물감이 심해서일 거야.
* 공 : 정겨운 요소가 없쟎아요.
* 김 : 공성훈씨가 그리는 대상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인데 그림 속에서 그것들을 목도하게 됐을 때는 이물감이 느껴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인데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단 말예요.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을 수 있쟎아요. 일종의 불편한 느낌이죠 뭐.
- 이후, 리히터의 RAF(Die Rote Armee Fraktion, 독일 적군파)를 그린 그림, 김인규교사 부부의 누드사진,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그림, 네오 라우크(Neo Rauch)의 그림 등을 대상으로 이미지가 한 사회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