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산 #8168, 2010, Laserchrome Print, 237.2×167.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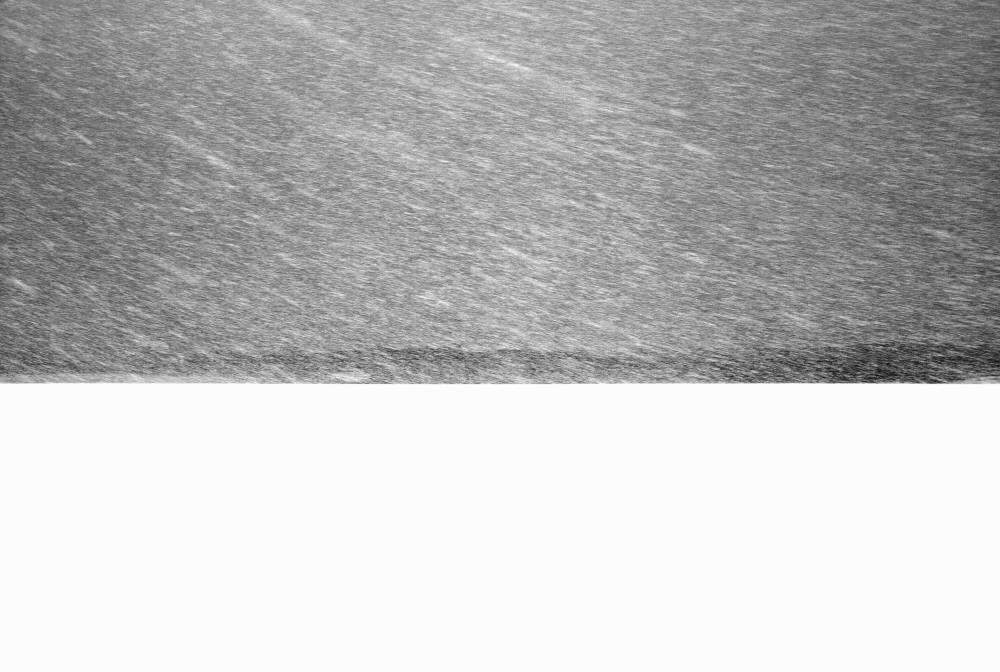
낙산 #2404, 2005, Lambda Print, 120x180cm

낙산 #4273, 2010, Laserchrome Print, 155.6×195.6cm
권부문 개인전 <산수와 낙산>은 신작인 <산수>연작과 2007년부터 국내외에서 발표해온 <낙산> 연작을 두 개의 독립된 공간에 펼쳐 보인다.
<산수>는 가장 최근작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사진에 결정적으로 뜻을 둔 계기가 된 1970년대 말의 인적 없는 밋밋한 풍경 사진이 30여 년의 세월을 거쳐 도달한 하나의 고지이다. 미디움의 본성을 고찰하고, 태도와 표현의 진정성과 내재성을 중시하는 모더니즘적 입장을 견지해온 작가가 ‘산수’라는 문화적, 역사적 함의가 깊은 주제를 선택한 것은 뜻밖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권부문의 ‘산수’는 포스트모던적 복고나 혼성의 이미지 차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명시해 둘 필요를 느낀다.
사진 이미지의 추구를 ‘대상 앞에 서기’의 방법론이자 결론으로 여겨온 작가는 풍경을 “바람 속의 구름”에 비유하면서, “풍경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실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드러나는 현상이다. 보는 자의 마음 상태와 해석력에 따라서 드러나기도 하고 무심히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¹라고 말한다. 따라서 풍경을 조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것이며, 거기서 얻어진 이미지는 때로 “무섭고 고독한 거울”²이 된다. 한편, 전통 미학에서 ‘산수’는 인(仁)의 덕을 갖춘 인격체나 도(道)를 구현한 물상으로, 그것을 그리고 감상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정화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산수관과 권부문의 산수에 대한 입장이 만나는 지점은 ‘태도로서의 이미지’라 하겠다.
권부문의 <산수>는 수묵화를 연상시키지만 들여다 보면 정밀한 디테일들이 장소에 대한 온갖 정보를 제공하여 초사실적인 느낌마저 들게 한다. 그러나 풍설과 그 속에 의연하게 자리하고 있는 나무나 돌에서 세한(歲寒)과 격절(隔絶)을 읽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서는 이미지가 요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자세가 된다. 장소의 조건들이 대상을 잘 드러내는 순간을 포착하여 이미지로 기록하는 것은 우연 같지만, 이미지는 내 앞에 펼쳐진 세계와 관계 맺는 가운데 얻어지는 총체적인 경험의 결론이다. 어떤 대상을 물리적, 정신적 차원에서 만나는 일이 일순간 한 장의 이미지로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나 자신도 늘 놀란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은 특정 상황의 선택이고 결론이다.”
권부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적막과 고독은 단지 이미지 속에 사람의 흔적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앞에서 보는 자는 철저히 혼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풍경 체험의 근간이다. 그 고독을 극복하면 자유로이 이미지 속을 소요하는 미적 경험을 누리게 된다. “내 작품에서 인간의 자리는 이미지 속이 아니라 이미지 앞, 내가 카메라와 함께 섰던 그 자리이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다.” 대형 화면은 작가를 포함해서 관객을 풍경 앞에, 즉 풍경 체험의 출발지점에 서게 하는 데 필요한 장치이다. 그런데 대형 사진이 요구하는 기술적, 물리적 노력은 “나에게 다가온 이미지를 섬긴다”는 자세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카메라와 프린터라는 기계를 통하여 이미지를 얻어야 하는 사진가는 화면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화가와 입장이 다르다. 또한 개발이 미치지 않은 구석이 없는 이 땅에서 사람의 흔적이 없는 경관을 포착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사실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풍경만이 작가가 말하는 “총체적 경험”을 유도해 낼 수 있으며 “환상이 드러나는 방식”이 된다. 그것은 <낙산>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작가는 2000년부터 종종 낙산의 바다를 모티브로 삼았지만 2005년과 2010년의 대설 속에서 장소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은 동해안 낙산이라는 지리적 장소를 넘어서 지극히 정신적인 풍경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누구나가 사진 이미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시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새로운 리얼리티를 만드는 오늘날, 사진은 풍요와 동시에 ‘사진’이라는 명칭 자체가 불분명하게 쓰이는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의 발명으로 재현의 의무에서 해방된 회화가 예측할 수 없는 모험에 뛰어들었듯, 사진도 이미지 속에 담긴 대상이나 이야기의 실재성을 지시하는 지표 (index)로서의 기능과 유효성을 의심받게 되면서 오히려 새로운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소재와 내용이 사진의 가치를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그것은 서술과 전달이 필요한 영역의 몫이다. 현대미술로서의 사진은 자기반성적이다. 제작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결정적이며 형식과 형태는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다. 이미지 제작이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빌어야 하는 만큼 작가의 의식은 다차원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세계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사진가의 특권이다. 권부문의 작업은 작가의 의식과 비전이 이 시대의 기술을 만나 현실과 정신의 이미지를 동시에 구현한 귀중한 예이다.
글 김애령
문의처
02 720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