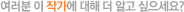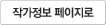w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말해놓고 대책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변명을 좀 하자면, 한동안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닥 평온하지 못한 시간을 보낸 탓입니다. 그러다가 그림 몇 점을 우연히 본 김에 당신께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본 것은 화가K의 작업실에서였습니다. 작업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한기가 들어 으스스 몸을 떨었습니다. 살얼음 깔린 계곡에서 먹이 찾는 가냘픈 다리를 가진 새와 파도치는 겨울 바닷가에서 맨 몸으로 앉아있는 어린아이, 달빛을 받으며 검은 실루엣으로만 남아있는 이파리 하나 없는 나무들로만 이루어진 풍경들이었으니까요. 화가K에 대해서는 언젠가 제가 당신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개가 있는 한밤중의 풍경을 그리다가 도시 근교의 그로테스크한 정경을 그렸던 화가 말입니다. 동시대 풍경이기도 하고 변두리인 저의 집 근처 풍경이기도 해서 매우 낯익지만 이상스레 낯선 느낌을 주던 그림이지요. 13년간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내 눈에 비친 내 나라의 기괴한 조합들이 주는 낯선 느낌을, 한국을 떠나 산 적이 없는 화가가 그대로 보여줘서 신기하다고 당신께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화가는 자기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두기“가 쉽지 않음은 당신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그가 얼마 전에는 촛불, 연꽃,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등장하는, 소재 자체만으로 보면 정치적인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는 풍경을 보여주더니 이번엔 차가운 겨울 풍경을 선보인 겁니다. 자연스레 보이려고 만든 우리들의 인공 자연을 거쳐 이번엔 진짜 자연풍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과연 진짜 자연일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직 손을 뻗칠 수 없는 하늘 공간만 보여주는 그림에서조차도 지나간 비행의 흔적이 남아있더라니까요, 글쎄. 순수한 자연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꿈꾸어온 유토피아의 한 형상이라면 그는 우리에게 „유토피아는 없어“라고 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에서 유난히 인상적인 건 복선처럼 깔린 두텁고 짙은 구름입니다. 그가 그린 하늘을 보고 있자면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지요. 그것이 화가K가 의도하는 „사건으로서의 풍경“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라는 화가들의 주문에 순순히 응할 수 없는 이유는 자꾸만 그림이 상징적으로 읽히기 때문인데 이번 그의 그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지만 그 전에도, 그 이후로도 당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우리네 일상이 그 풍경에 녹아있는 것만 같아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림을 읽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의 그림을 „눈으로 보자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 이 화가, 정말이지 너무 잘 그립니다. 풍경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그의 그림에 매혹되는 건 그림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화면입니다. 예술이 갈수록 개념적이 되어가고 뛰어난 손놀림을 마치 무슨 치욕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그는 „회화는 무엇보다 몸으로 하는 작업“임을 진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살얼음이나 물의 표면에 반사된 차가운 달빛이, 폭풍을 몰고올 것 같은 하늘, 혹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몸을 섞은 바위나 고독한 나무의 몸체를 보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가졌을 몰두와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칠고 두터운 붓자욱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 감정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듯, 조심스레 자신의 자욱을 지워 평평한 화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의 손자욱과 과정을 지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이 화가는 내용적인 면에서나 캔버스 표면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 모두, 마치 숨바꼭질하듯 키치와 진중함 사이를 교묘하게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같은 관람자는 그 안에서 숨기면서 드러내고, 드러내었다 싶으면 사라져버리는 작가와의 숨바꼭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회화예술은 끝났다고 이야기되는 오늘날, 회화예술이 본래 무엇이었던가를 묻는 것같은 그의 그림은 사실 좀 위험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군요. 예술가는 패배하고 또 패배하면서, 자신이 패배할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받았던 쨍, 한 겨울 풍경이 마냥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문제의식을 묵직하게 밀고 나가는 이 작가의 차가운 열정 덕분입니다. 형용모순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군요. 절제와 단순화가 쉽지 않음을 또 한 번 절감합니다. 다음에 또 우연히 어디선가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한 기후가 일상적이 되어가는 초여름에,C가.